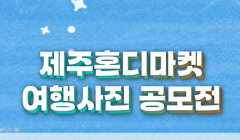최신기사
- 전주시, 새벽 출근 산단 노동자에 든든한 한 끼 식사 지원
- 제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결과 ‘이상 무’
- 익산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공유회 개최
- 제주시,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시행
- 제주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전주시, 제9기 청년희망단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진행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유튜브에는 없는 것, 도서관에 있는 것
- 김제시, 제2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국비지원 강력 촉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미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개편지원팀장 박대진
헤럴드신문
2025년 01월 19일(일) 11:45 가+가-
2025년 01월 19일(일) 11:45 가+가-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개편지원팀장 박대진
[헤럴드신문] 경로당을 찾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설명할 기회가 종종 있다. 막상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나조차 익숙하지 않았을 ‘기초자치단체’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들께 쓰려고 하니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요즘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시장과 시의원을 우리가 직접 뽑고, 시청이 도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의미에서 독립은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완전한 자주권 확보를 뜻하므로, ‘자치권’ 확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독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독립이란 말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꾸리는 것과 빗대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자치권을 얻는 것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이 없다. 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자녀와 다를 바 없다.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한 집에서 살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게 되어 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자녀라 해도 종속 관계에서는 중요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더 큰 성공을 이루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독립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는 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독립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지는 주권자인 도민의 뜻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요즘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시장과 시의원을 우리가 직접 뽑고, 시청이 도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의미에서 독립은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완전한 자주권 확보를 뜻하므로, ‘자치권’ 확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독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독립이란 말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꾸리는 것과 빗대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자치권을 얻는 것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이 없다. 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자녀와 다를 바 없다.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한 집에서 살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게 되어 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자녀라 해도 종속 관계에서는 중요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더 큰 성공을 이루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독립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는 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독립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지는 주권자인 도민의 뜻에 달려 있다.
헤럴드신문 기사 더보기
hrd299@naver.com
정치
사회
Copyright © 2019 헤럴드신문. All Rights Reserverd.